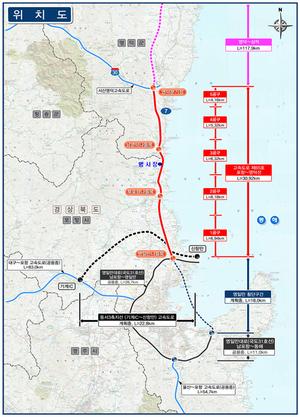|
| 황규일 /(전) 천안과학산업진흥원장 |
[시사코리아저널=이선우 기자] 공공기관의 장으로 일한 2년은 내 인생에서 가장 밀도 높고 성찰적인 시간이었다.
그 기간 동안 나는 공직사회와 공공기관의 현실을 가까이서 보며, 제도와 규정보다 더 큰 힘이 결국 ‘사람’과 ‘마음’이라는 사실을 깨달았다.
지자체 공무원은 잦은 보직 순환과 승진 압박 속에서 일한다. 한 분야를 충분히 이해하기도 전에 새로운 업무를 맡게 되는 구조 속에서, 눈앞에 바로 드러나는 단기 성과에 집중할 수밖에 없다.
반면, 산업과 과학기술을 다루는 전문기관은 5년, 10년 이후를 내다보며 기업 생태계를 키워야 한다. 이 간극은 행정과 현장 사이의 오해와 피로로 이어진다.
의회 또한 예산을 감시하는 중요한 축이다. 날카로운 질문과 건전한 비판은 행정을 바로 세운다.
그러나 때로는 정책 개선보다 보여주기식 질책에 치우칠 때도 있다. 그 순간 공공기관은 위축되고, 시민이 맡긴 세금과 행정에 대한 신뢰는 흔들린다. 예산은 기관장의 돈이 아니라 시민의 세금이다.그만큼 투명하고 정당해야 한다.
공공기관의 기관장 자리는 단순한 ‘자리 하나’가 아니다. 정책과 현장을 연결하고, 행정과 시민 사이에서 신뢰의 균형을 세워야 하는 자리다.
전문성과 도덕성을 갖춘 인물이 공정한 절차를 통해 선발되고, 성과로 책임을 증명해야 한다. 이 과정이 형식이 아니라 실질로 작동할 때, 공공은 비로소 살아 움직인다.
나는 공복(公僕)을 이렇게 정의하고 싶다.
“국민의 혈세로 급여를 받는 사람은, 그만큼의 책임을 성과로 갚아야 한다.” 그 성과는 거창한 숫자나 대형 사업이 아니라, 시민이 체감하는 변화여야 한다.
불필요한 낭비를 줄이고, 필요한 곳에 예산을 제대로 쓰며, 정책을 조금이라도 더 합리적으로 바꾸는 모든 노력이 곧 성과다.
공직자에게 필요한 것은 완벽함이 아니다. 겸손한 학습 태도와 책임지려는 마음이다.
모르면 묻고, 현장을 더 잘 아는 사람에게 배우며, 전문가의 의견을 경청해야 한다.
시의원도, 공무원도, 기관장도 예외가 아니다. 이런 자세가 쌓여야 공공의 신뢰가 회복된다.
나는 지금도 스스로에게 묻는다. “내 자리를 지키며, 나는 과연 책임을 성과로 증명하고 있는가.” 그 질문을 잊지 않는 한, 공공의 길은 분명 조금씩 더 나아질 것이다.
이선우 기자 lsw102424@naver.com